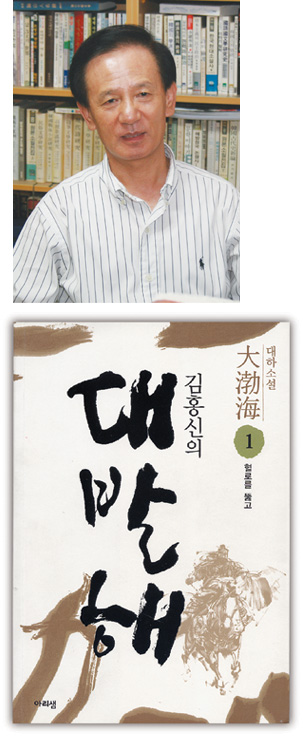
한의계에 있어 김홍신 전 의원은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한의사 국회의원이 없던 시절 김 전 의원은 한의계의 울분을 달래주고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에 낙선하면서 한의사의 뇌리에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됐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소설 ‘대발해’를 출간하면서 다시 한 번 한의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 소설에서 한의학은 한의사 신재용이 발해 태조 대조영을 도와 발해건국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3대에 걸쳐 황제의 스승인 太傳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을 매개로 소개된다.
잃어버린 대륙을 민족사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중국과 일본, 신라, 거란, 말갈, 인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외교의 중심무대였던 발해를 소설화했다는 자체로 민족사적 의미가 큰데다 소설의 주요줄거리가 한의학과 밀접한 연관 속에 전개되고 있어 뭇 한의사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 “의학은 역사소설의 주요 소재”
그럼 그가 왜 한의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일까? 물론 여기서 주인공 격으로 내세운 신재용은 그의 친구 한의사 신재용의 이름을 차용했다. 신재용을 통해 작가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의 치료는 물론 군마의 관리방법, 평화 시 왕실 내 주요인사와 백성들의 식생활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어느 한 가지도 의료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가 의료인의 역할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역사소설 속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역사소설의 하나인 삼국지에 독화살을 맞은 장군을 명의인 화타가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자세히 기술되지 않은데 비해 ‘대발해’는 임신, 혈자리, 말치료 방법 등이 다 나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말 치료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전쟁 시 말은 장정 3명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현대 전쟁에도 의술의 역할은 지대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지금도 의사가 없으면 군대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전쟁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의술의 역할이 큰데 옛날에는 오죽하겠느냐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당시 한의학은 군진의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셈이다.
그는 점성술, 의술, 음식 등도 醫者의 몫으로 분류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강성국의 주요 특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강성국의 특징으로 의술, 병장기, 문자, 문화, 의복(채색)을 들었다. 그만큼 의술은 인간 존중의 정신과 더불어 강성국의 척도가 된다는 관점에서 ‘대발해’의 얼개를 짰다.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의학이 발전한 나라라고 보아 의도적으로 발해를 의술이 발전한 나라로 그렸다는 것이다.
의술이 발전한 강성대국으로 발해를 그리기 위해 그는 친구인 신재용 원장은 물론 허창회, 안재규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들은 내용을 글로 옮겼다고 한다. 특히 신 원장에게는 새벽 2시에도 전화를 걸 정도로 막역했다.
“글을 쓸 때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이를 때면 그냥 전화했어요. 가령 ‘혼절할 때 깨어나는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신 원장은 ‘손가락을 쥐어 중간 오는 자리에 침을 놓으라’고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지요.”
그가 한의학에 관련된 부분을 기술할 때 한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았다. 스스로 한의학서적을 보고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글을 써내려갔다. 그의 서가에 꽂혀 있는 ‘찬도방론맥결집성’, ‘침구대성’ 등 수많은 한의학서적은 그가 평소 한의학의 가치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 결과 그는 난해한 한의학지식을 한의학에 대한 문외한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설 속에 쉽게 풀어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대발해’를 읽은 한의사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한의학에 관련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썼느냐’면서 ‘놀랐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고 한다.
■ 한의학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
김홍신 작가가 한의학을 처음 접한 것은 동양의대를 다니던 친구 신재용이 문학을 하기 위해 건국대 사학과에 편입하면서부터다. 국문과를 다니던 김 작가는 신재용과 같은 문학 서클에서 만난 것이다. 졸업 후 경희대 한의대에 다시 편입해 5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신재용과 교류하며 한의학서적을 읽고 토론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졌다.
신재용과의 인연으로 한의학을 알기 시작됐지만 글을 쓰면서 이상하리만치 한의학서적을 많이 보게 됐다고 한다.
더우기 수채 구멍에 뜨거운 물을 버리려 할 때 할머니가 ‘애들아, 뜨거운 물 뿌린다’ 하고 버리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태교사상이 된 것을 보면 ‘나 이외에 모든 사물이 소중하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더불어 우리의 민족성을 한꺼번에 느낀다고 한다. 신씨 일가가 태부가 되어 태교하는 법과, 전쟁이 끝난 뒤 죽은 적을 위해 먼저 제사지내고 그 다음에 아군, 마지막으로 산천에 제사지내도록 황제를 가르친 것을 ‘대발해’에 기술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상황을 그는 “한국인인 게 너무 행복해 황홀경 속에서 글을 썼다”고 표현한다.
그의 한의학관을 듣고 있노라면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절로 느껴질 정도였다.
“풍토와 섭생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린 남부지역부터 러시아 연해주까지 같습니다. 중국은 남방계이므로 우리와 다릅니다. 의술은 그 나라 특성에 맞게 개발되다 시간이 지나면 고유의 의술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다시 글로벌시대가 되면 세계 공통의 의술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한의학이 중국 중의학을 베낀 게 결코 아니지요.”
한의학에 대한 예찬은 끝이 없었다.
“의학에서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한의학입니다. 꽃, 열매, 뿌리, 줄기를 이용해 인체에 유용한 약을 만들고 침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의학입니까?” <계속>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